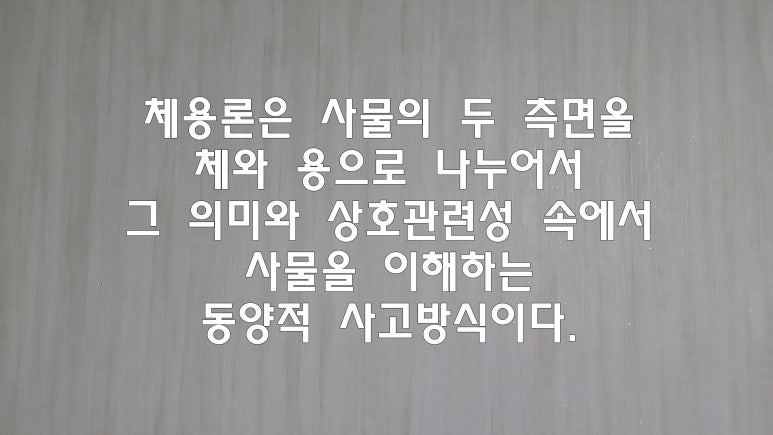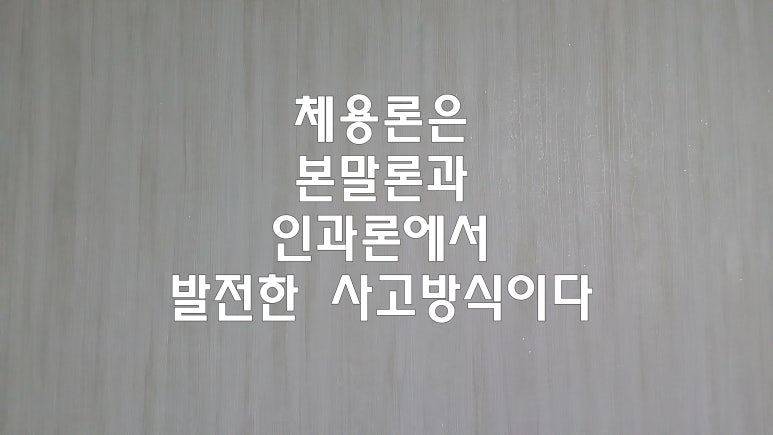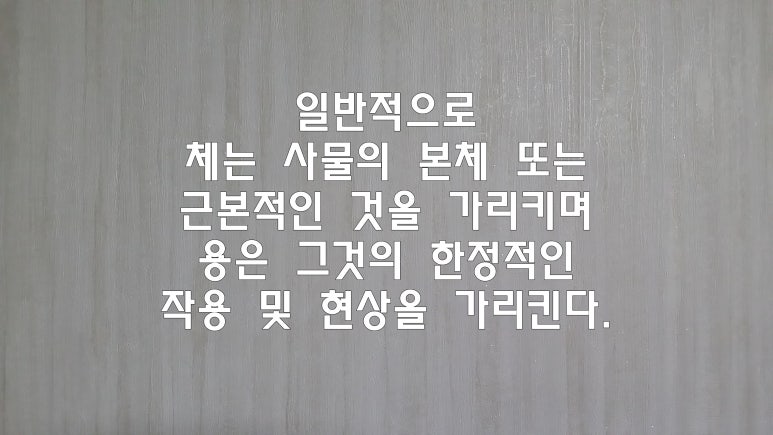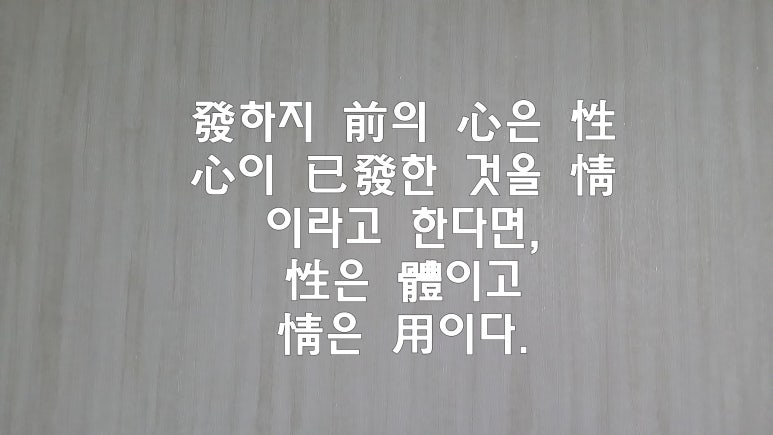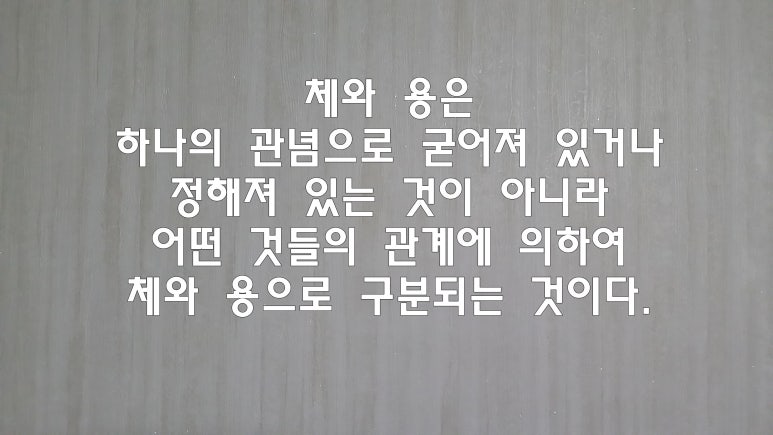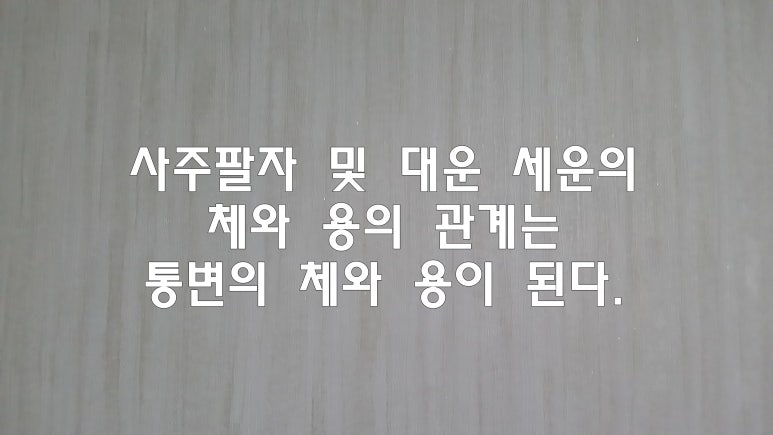오늘은 사주의 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용론은 동양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한 방법입니다. 즉 체용론은 사물을 이태(二態) 즉 체(體)와 용(用) 두 측면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의미와 상호관련성 속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오래된 동양적 사고방식입니다.
하안(何晏)과 왕필(王弼)은 본말(本末)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도가(道家)의 무(無)와 유(有)를 본말론으로 체계화 하였지요. 그들은 변화가 무궁한 만물에 대하여 그 본체인 無는 적연부동(寂然不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본체가 있어야 그에 따른 각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불교에는 인과론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인과론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바람과 파도의 관계로 보았지요. 인과론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별개의 것이었지요.
하안과 왕필의 본말론과 불교의 인과론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의 사상적 발전과정을 보면, 하안과 왕필의 본말론이 훗날 불교의 인과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체용론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는 주로 사물의 본체 또는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며, 용은 사물의 작용 또는 현상(現像), 파생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혹자는 체가 본질적인 존재로 형이상학적 세계에 속하고, 용은 그것의 자기 한정적 작용 및 현상으로 형이하학의 셰계에 속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와 용은 단순히 형이상과 형이하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와 용은 둘 다 형이상일 수도 있고, 둘 다 형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주희(朱熹)의 의견을 빌리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의 경우 <아득한 것>이 체가 되고 그것이 사물 사이에서 발현되면 그것이 용입니다. 형이하학적인 경우에는 사물이 체가 되고 그 사물의 이치가 발현되는 것이 용이 됩니다. 마음도 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희 같은 경우에는 <發하기 前>을 심을 체로 보았으며, 이미 <발한 때>를 심을 용으로 보았지요. 이것은 <心의 未發을 性>이라고 하고, <心의 已發을 情>이라고 정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즉 性은 體고 情은 用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은 정현(鄭玄)에게서도 나타나요. 정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체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퇴계 이황과 기대성의 사단칠정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지요. 물론 퇴계와 율곡의 理氣 논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계가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며 체용론을 끌어들였어요. 즉 理가 體이고 理가 象으로 드러난 것이 用이라는 논리였지요. 즉 주희의 理를 다시 체와 용으로 나눈 것이지요.
사실 정이(程頤)가 주장하는 우주의 근본으로서의 理와 그 발로로서의 事象이나, 장재가 말하는 태극과 기, 주자가 말하는 性과 情의 관계 등은 체용론의 개념입니다.
체용론에서 체와 용은 불이(不二) 즉 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두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예요. 오히려 체용은 상대적이면서도 표리일체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체를 떠나서 용이 있을 수 없고, 용을 떠나서 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개념상으로는 분류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분류할 수 없는 합일적 존재를 설명하기 위하여 추상적 범주로 체와 용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두고 설명하면 체용론에 변형이 나타납니다. 일단 우주의 실체가 체라면 체가 변동하여 드러나는 우주의 수많은 형상은 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형하여 달리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음양론의 음양 구분처럼, 天이 체라면 地가 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태양이 체라면 달을 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明이 체라면 暗이 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극과 태극의 관계로 치환하면, 무극이 체라면 태극을 용이라고 봅니다. 다시 태극이 체라면 음양을 용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음양이 체라면 四象이 용입니다. 사상이 체라면 당연히 팔괘가 용이 되겠지요. 즉 체와 용의 관계는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무극이 체라면 태극이 용이고, 태극이 체라면 음양이 용일 때, 음양 자체도 다시 체와 용으로 구분됩니다. 즉 음이 체라면 양이 용이라는 것이지요. 動靜의 경우 靜이 체라면 動이 용입니다. 陰이 체고 陽이 용이고 靜이 체이고 動이 용인데, 이것이 실제 사물이나 현실로 나타나면 그 관계가 전환되기도 합니다. 즉 天이 체라면 地가 용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태양이 체라면 달이 용이고, 明이 체라면 暗을 체라고 합니다.
즉 체와 용은 하나의 관념으로 굳어져 있거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의 관계에 의하여 체와 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천간이 체라면 지지가 용입니다. 오행이 체라면 오운은 용입니다. 그리고 命과 身의 경우에도 명이 체라면 신이 용입니다.
이것을 사주팔자에 적용하면, 일간이 체라면 월지가 용입니다. 그리고 일간이 체라면 나머지 일곱 글자가 용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즉 사주원국이 체라면 10년마다 바뀌는 대운이 용입니다. 그리고 사주원국과 대운을 하나로 묶어서 체로 보면, 세운이 용입니다. 다른 한편 사주원국에 나타난 실자(實字)가 체라면 사주원국에 나타나지 ㅇ낳은 허자(虛字)는 용입니다. 그리고 격국이 체라면 격국용신이 용입니다. 물론 격국용신과 희신을 놓고 볼 때는 격국용신이 체이고 희신이 용이지요.
오늘은 명리학의 사주에 나타나는 체용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 부분에서 너무 많은 설명을 하였네요. 앞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후반부의 사주명리학의 체용 부분만 익히셔도 됩니다.
[출처] 사주의 체와 용 (四柱體用)|작성자 행운메이커
'명리학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주 카폐 道慧 (지혜에 이르는길) 격각 (0) | 2018.09.22 |
|---|---|
| 사주 카페 道慧 (지혜에 이르는 길) - 유유형 (0) | 2018.09.21 |
| [ 사주 카페 도혜]역학암기 (0) | 2018.09.18 |
| [사주 카페 도혜] 월령 (0) | 2018.09.15 |
| [사주 카페 도혜] 사령 (0) | 2018.09.15 |